사대주의를 생각함
―소국이 대국을 섬겨야만 하는
사대주의는 나라의 존립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국가가 어려울 때일수록
대승적 사고를 가져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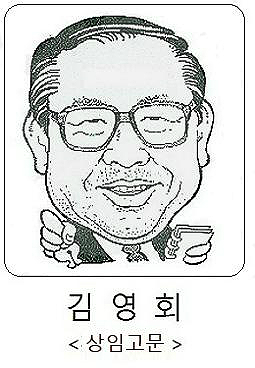
즉위한지 7년 째 되던 1425년 2월 11일, 세종 임금은 하루 종일 분주했습니다. 서울에 들어온 명나라 칙사들을 접대하는 일 때문이었습니다. ‘세종실록’에는 그날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명나라 사신이 서울에 들어오니 임금이 왕세자와 신하들을 거느리고 모화루(慕華樓)로 거둥하여 칙사(勅使)를 맞이했다. 창덕궁에 이르러 정해진 의식대로 예를 행하였다.
임금과 사신들이 마주 두 번 절하고 다례(茶禮)를 거행했다. 채붕(彩棚·누각형태의 무대)에서 잡희(雜戲·공연)를 행했는데, 궁궐의 문과 다리의 결채(結彩·임금이나 칙사가 지나가는 길에 걸었던 장식)는 전에 비해 더욱 아름다웠다. 임금은 칙사들과 차를 마시고 명태조가 보낸 칙서를 받았다. “황제는 조선 국왕에게 유시하노라. 조선 국왕의 충성을 가히 여겨 내관 윤봉과 박실을 보내어 왕과 왕비에게 채폐(彩幣·비단)를 하사하여, 그 가상함을 포장한다.”라고 적혀 있었다.
임금이 태평관(太平館)에 거둥하여 하마연(下馬宴)을 베풀고 저녁에 궁으로 돌아왔다. 지신사 곽존중을 보내 두 사신에게 각각 옷 한 벌과 갓, 신발, 안장을 갖춘 말 등을 선사하고, 두목(頭目), 지휘(指揮), 천호(千戶) 이하에게 또한 각기 갓과 신발, 안장과 말을 선사했다.―
위에 묘사된 내용은 그야말로 칙사 대접의 실상을 잘 보여 줍니다. 임금이 맞절을 하고, 영빈관과 숙소를 직접 방문하여 연회를 베풀고, 다시 신하를 보내 문안하고 선물까지 주는 장면은 오늘날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쉽지 않지만 당시에는 소국이 대국의 사신에게 당연히 해야 했던 의례와 절차였습니다.
고려를 멸하고 1392년 왕위에 오른 이성계는 명나라로 사신을 보내 새 나라의 건립을 보고하는 한편 미리 준비한 조선(朝鮮)과 화령(和寧), 두 이름 가운데 하나를 국호로 정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명나라 태조는 둘 중에서 조선을 낙점합니다. 조선이라는 국호가 명나라 황제에 의해 채택된 것은 1393년 2월 15일 이었습니다.
그럼 세종은 왜, 그처럼 중국 사신들에게 저자세로 칙사 대접을 했을까? 알다시피 조선은 건국 이후 중원의 대국인 명(明)을 ‘상국’이자 ‘천자국’으로 섬기며 정기적으로 조공(朝貢)을 바치고 스스로 제후국임을 자임했습니다.
임금이 되려면 명나라 황제의 책봉을 받아야 했고 그들의 역(曆)과 연호(年號)를 사용해야했습니다. 조선이 이렇게 사대(事大)의 자세를 취한 것은 대국인 명나라의 군사적, 정치적 위협에서 벗어나 국가의 존립을 도모하려는 현실적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세종은 특히 명나라에 대해 지성을 다했습니다. 즉 지극한 사대로써 명나라의 의구심과 위협을 누그러뜨리는 한편, 안으로는 자신에 대한 신료들의 충성을 이끌어내고 궁극적으로는 이상적인 유교국가 체제를 완성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사대사상은 비단 세종만이 아니었습니다. 소국의 제왕이 사직을 이끌려면 온갖 수모를 견디고 예를 갖춰 대국에 충성을 다해야 했던 것입니다.
조선조 초년의 필독서가 된 ‘동몽선습(童蒙先習)’에 “위대한 명나라가 하늘 가운데 솟아오르니 성스럽고 신령한 자손들이 계승하여 천만년 영원할 것(大明中天 聖繼神承 於千萬年)”이라고 축원했던 것은 그러한 인식을 웅변으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또 선비들 가운데도 명나라를 상국이자 천자국의 차원을 넘어 ‘부모국’이자 ‘일가(一家)’로 인식하는 이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조선을 명나라와 동일시하면서 중국인보다 더 철저한 중화인(中華人)이 되기를 희구했고, 그 같은 지향을 바탕으로 일본이나 여진 등을 오랑캐로 비하하는 태도를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세종대 이후 조선과 명나라의 관계가 안정 궤도에 오르자 두 나라 사이에는 사신이 자주 오갔습니다. 조선은 하정사(賀正使), 성절사(聖節使), 천추사(千秋使) 등 1년에 세 차례 보내는 정기적인 사신 이외에도 다양한 명목의 비정기 사신을 명나라에 보냈습니다. 세종대에 명나라에 사신을 보낸 것이 모두 131차례였고 명나라 역시 조선으로 사신을 보내 온 것 역시 188회나 되었습니다.
칙사가 서울에 들어오면 첫날엔 하마연(下馬宴), 이튿날엔 익일연(翌日宴) 등 날마다 잔치를 베풀고 또 칙사들에게 예물과 예단을 증정하여 환심을 사려했고, 칙사가 귀국할 때는 환송의 의미에서 상마연(上馬宴)이라는 고별잔치를 열어 후하게 대접해 보냈습니다.
당시 조선에 왔던 칙사들 중에는 환관(宦官)이 많았습니다. 그들 칙사는 그때마다 갖가지 무리한 요구로 조정을 괴롭혔습니다. 처녀나 말, 매, 은(銀)을 요구했고 신료들은 그 요구를 들어 주느라 애를 먹곤 하였습니다.
실제로 1429년, 윤봉이 명으로 귀환할 때 챙겨갔던 물품은 무려 200궤짝이나 되는 엄청난 분량이었습니다. 궤짝 1개를 나르는 데 여덟 명의 인부가 필요할 정도였으니 그 규모를 알만합니다.
명나라 칙사들의 괴롭힘은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한층 심해졌습니다. 일본이 조선을 침략해 질풍노도로 강산을 휩쓸 때 이여송이 거느리는 명군이 평양전투에서 일본군을 격퇴시키자 조야(朝野)는 감격합니다. 조선은 명나라를 재조지은(再造之恩)이라며 나라를 다시 세워준 은혜로 여겨 숭앙했고 그 은혜에 보답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넘쳐났습니다. 명나라는 이제 ‘상국’ ‘일가’를 넘어 은인으로까지 칭송되었습니다.
7년에 걸친 전쟁이 끝난 뒤 명나라는 과거보다 훨씬 어려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특히 명의 칙사들은 은과 인삼을 탐닉해 가는 곳마다 떼를 써 그 요구를 들어 주느라 애를 먹었습니다. 선조실록에는 “의주에서 서울에 이르는 수 천 리에 은과 인삼이 한 줌도 남지 않았다”고 통탄할 정도였습니다. 그들이 강탈해간 은은 수만 량에 달했던 것입니다.
그 뒤 명을 이은 청나라는 1637년 인조가 서울 송파 삼전도에서 소위 삼배구고두례(三拜九叩頭禮)라는 치욕적인 항복을 받아 낸 직후부터 빈번하게 조선에 칙사를 파견했습니다. 1636년부터 1880년대까지 청은 적게 잡아 160여 회, 많게 잡으면 245회 칙사를 보내왔습니다. 지난 날 우리나라가 대국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고초를 당했는가를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최근 일본의 경제보복에서 발단이 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로 몸살을 앓은데 이어 미국정부가 주한미군의 주둔경비로 내년부터 매년 50만 달러를 내라고 우리 정부에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1조원을 넘길 때도 논란이 있었는데 이제 그보다 다섯 배나 되는 5조원이 넘는 천문학적 액수의 큰돈을 내 놓으라고 강요하고 있으니 참으로 어이가 없고 기가 찹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에 능한 사람이라고는 하지만 언필칭 혈맹이라고까지 하는 두 나라 사이에 마치 봉을 만난 듯 무리한 요구를 강권하는 것은 놀라움을 넘어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사대주의(事大主義)는 자율적이지 못하고 자국보다 강한 국가, 세력에 복종하거나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려는 주의를 말합니다. 이럴 때 일수록 국론을 모아 한 목소리로 대처하는 국민적 지혜가 필요합니다. 혼란한 시기에 친미니, 친중이니, 친일이니 하는 분열된 소리가 나와서는 안됩니다.
국내문제에 이견이 있는 것은 그렇다 해도 국가적인 명운이 걸린 문제만은 온 나라가 하나가 되는 대승적 사고가 필요합니다. 옛말에 “호랑이에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했습니다.
(韓國民族文化大百科事典, 經國大典, 大典會通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