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렁에 빠진 사법부
―가을이 깊었습니다.
사람들은 오색단풍 물든
산으로 향해 달려갑니다.
근교의 단풍도 절색…
작은 행복은 어떨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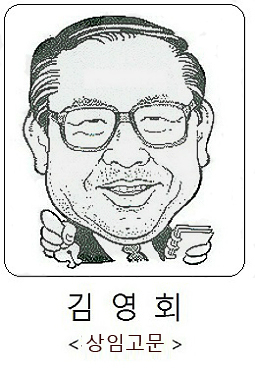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입구에는 아름다운 여신상(女神像)이 있습니다. 오른 손에 저울을, 왼손에 법전을 들고 있는 이 우아한 조각상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여신 디케(Dike)를 형상화한 것으로 흔히 ‘정의의 여신상’이라 부릅니다.
법의 엄중함과 재판의 공명정대함을 상징 하는 여신상의 오른손 저울은 재판의 공평무사(公平無私)함을, 왼손의 법전은 엄격한 법의 집행을 상징합니다.
사법부의 최고기관인 대법원이 이 여신상을 세운까닭은 법의 엄정함과 공평한 재판을 국민에게 약속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디케는 ‘정의의 여신’입니다. 나라마다 차이는 있지만 원래 유럽에서 이 여신상이 처음 만들어 질 때는 천으로 눈을 가리고 오른 손에 칼을, 왼손에 저울을 들고 있는 것이 원형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눈을 가리지 않고 칼 대신 법전을 들고 있는 보다 한국적인 부드러운 모양으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여신이 눈을 가린 것은 선입견 없이 공평한 판결을 한다는 뜻이고 칼을 든 것은 가차 없이 법대로 단호하게 재판한다는 의미입니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법원은 그 사회 정의의 최후 보루입니다. 죄지은 사람은 벌을 받고 남을 해친 사람은 예외 없이 죗값을 치러야하기에 그가 누구이건 법 앞에서 엄숙히 옷깃을 가다듬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역사상 어느 때도 볼 수 없던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사법농단이라는 전대미문의 회오리에 휩쓸려 최고위직 법관들이 줄지어 검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고, 구속되고 끝내 사법부의 수장인 직전 대법원장마저 포토라인에 서게 된 판국이니 참으로 딱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경위가 어떠했던 사법부는 그동안 유지돼온 국민적 신뢰가 한꺼번에 와르르 무너지는 지경에 이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처럼 감춰져 있던 사법부의 민낯이 백일하에 드러나는 것을 보는 국민들의 심정은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어쩌다가 이 꼴이 되었는지,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사법부가 국민의 눈총을 받는 곤궁한 형편에 처해져 있지만 과거에는 곧고 당당하게 행동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은 법관도 있었습니다. 김병로(1888~1964). 1948년부터 1957년까지 초대 대법원장을 역임한 분입니다. 일제치하에서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그는 대한민국의 사법기틀을 세우고 청빈한 생활로 만인의 사표가 되었습니다. 이승만 자유당 독재 정권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사법부를 지킨 법조인의 표상이었습니다.
1952년 이승만 대통령의 정적(政敵)인 서민호의원이 자신을 살해하려던 군인을 사살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정당방위’라며 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 이에 격노한 이 대통령은 “현역장교를 권총으로 쏘아 죽였는데 무죄라니, 될 말인가”라며 김 대법원장에게 크게 화를 냈습니다.
그러자 김 대법원장은 “판사가 내린 판결은 대법원장인 나도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 없는 것이오. 무죄 판결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절차를 밟아 상소하면 되지 않소”라고 맞받았습니다.
전북 순창에서 태어난 김 대법원장은 일본 메이지대학 등에서 법학을 배우고 고국으로 돌아와 잠시 판사를 거쳐 일제의 박해를 받는 동포를 위해 변호사생활을 했습니다.

정부수립과 함께 대법원장이 된 그는 민법과 형법, 형사소송법 등 우리 사법의 근간이 되는 법률의 기초를 닦고 사법부 독립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그의 청렴하고 강직한 삶은 두고두고 후학들에게 회자(膾炙)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장 시절 결재 도장이 반 토막 날 정도로 닳았어도 바꾸지 않고 계속 사용한 일, 박봉에 시달리던 판사가 사표를 들고 찾아오자 “나도 죽을 먹으며 산다. 함께 참고 고생해 보자”고 만류해 판사가 사표를 거두기도 한 일등은 그의 삶이 어떠했는가를 보여주는 일화입니다.
그는 판사 회의에서 “법관들은 오직 정의의 수호자가 됨으로써 사법의 권위를 세우는 데 휴식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역설하곤 했습니다.
국민이 사법의 신성한 권위를 존중하는 건 한 점 부끄럼 없는 공정한 재판을 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러지 않고 권력자와 뒷거래를 하고 뇌물이 오고가는 재판을 한다면 국민들은 사법부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치우침이 없는 추상같은 판결이 강조되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과거 우리는 대법원 판결로 역사에 묻혔다가 재심으로 판결이 뒤바뀐 사례를 심심치 않게 봐왔습니다. 대법원의 사형언도로 형장의 이슬이 된 이가 세월이 흘러 재심에서 무죄가 되어 명예를 회복한 이가 어디 한 두 명인가. 유전무죄(有錢無罪), 무전유죄(無錢有罪)로 돈이 있는 사람은 죄를 짓고도 무죄가 되고 돈이 없는 사람은 억울하게 죄인이 된다는 국민의 서글픈 탄식이 나온 게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천민자본주의의 전형(典型)입니다.
어쩐지 이따금 대법원의 판결을 보면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곤 했던 게 한 두 번이 아닙니다. 법이란 무엇입니까. 쉽게 말해 정상적인 상식을 가진 국민의 보편적인 생각이 법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한 국민 정서와는 다른 판결을 보아 온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었습니다. 하다면 작금의 파동은 사법부 자신이 불러 온 자업자득인 셈입니다.
오늘 우리가 2000년 전 솔로몬의 명 재판을 이야기 하는 것은 사건의 감춰진 진실을 파악하고 추상같은 법정신으로 공명정대한 재판을 했다는 솔로몬왕의 지혜를 높이 산 것입니다.
이 기회 사법부의 전 구성원은 뼈를 깎는 성찰을 통해 새로 태어난다는 각오아래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를 되찾아야 합니다. 재판은 국민들이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의지할 수 있는 최종적인 수단입니다. 그마저 믿을 수 없다면 국민들이 기댈 곳은 없습니다.
만추(晩秋). 가을이 깊었습니다. 절기상으로는 입동(立冬)이 지났으니 겨울이 분명하지만 시절은 아직 가을색이 완연합니다. 지금 전국의 산들은 울긋불긋 오색단풍으로 물들어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때를 놓칠세라, 예의 단풍객들을 태운 관광버스들이 전국의 도로를 메우고 있습니다. 여전히 부지런한 이들이야 백리 길을 마다않고 단풍을 즐기려 명산으로, 명산으로 달려갑니다.
요즘 ‘소확행’이라는 신조어가 유행입니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의 줄임말이랍니다. 길가 플라타너스도, 공원 은행나무도 물들고 가까운 교외에도 나무들은 아름답게 물들었습니다. 굳이 멀리가지 않더라도 근처의 단풍을 보는 것도 ‘소확행’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상은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