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을 생각하며>
국회의원이 뭐길래
ㅡ권력은 마약과 같은 것,
유혹을 피하기도 어렵고
그것을 끊는 건 더 어렵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여름밤의 부나방처럼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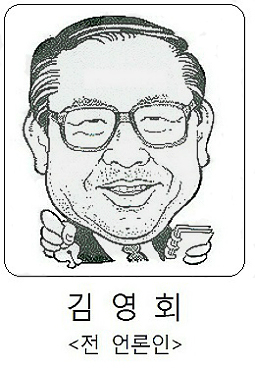
북한의 4차 핵실험과 로켓 발사를 계기로 남북관계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눈에는 눈, 이에는 이’식으로 마주 보고 달리는 열차처럼 위기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즐거운 설 연휴를 마친 국민들은 참으로 당혹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4월 13일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지금 전국 곳곳은 대목을 앞둔 시장판처럼 서서히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설 명절에 출마후보자들의 예비선거전이 활발해지면서 60여일 앞둔 선거는 이미 시작된 것이나 다름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는 여・야가 똑같이 선거구 획정, 당권, 공천을 놓고 전에 못 보던 분란에 빠져 있다는 점이 특이합니다.
공천권을 둘러싸고 둘로 갈려 권력투쟁을 벌이는 여당. 그런가 하면 대통령을 당선시킨 공신(功臣)들이 이당, 저당 야당으로 넘어가고 최고위층의 1급 정보를 소지한 전 비서관이 야당으로 들어가 청와대가 바짝 긴장하는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선거를 목전에 두고 새 당을 창당해 둘로 쪼개진 야권 또한 감정싸움으로 예전에 못 본 진기한 광경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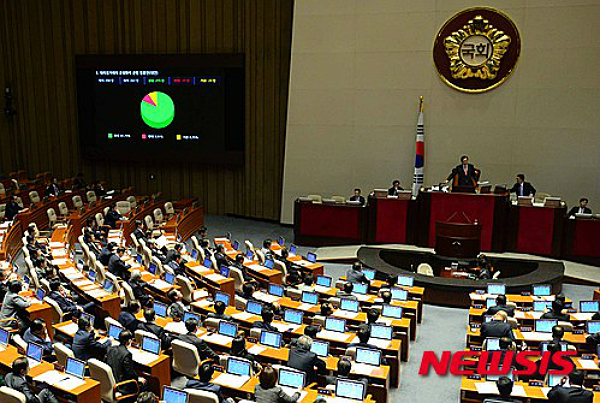
여・야당이 똑같이 어제의 동지가 오늘 적이 되고, 적이 동지가 되는 이 어지러운 현상은 정치도의나 신의라고는 찾아보기 힘든 ‘막장드라마’라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공자의 문하생 가운데 안회(顔回․BC521~491)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학덕이 높고 인품이 뛰어나 공자는 제자들 중 그를 가장 아꼈습니다. 안회는 스승과 대화를 하면서 한 번도 뜻을 거스른 적이 없이 스승을 따랐고 공자는 평소 그런 안회를 귀하게 여기고 보살폈습니다.
그런데 안회는 생활이 몹시 곤궁했습니다. 공자는 어느 날 그의 가난을 보다 못해 넌지시 말을 건넵니다. “회야, 그대는 학덕이 훌륭해 벼슬길에 나가면 고생길은 면할 수 있을텐데…, 생각이 어떠한가?”
안회는 “선생님, 싫습니다. 저는 성 밖에 있는 논에 농사를 지으면 굶지는 않고 성안의 밭에 목화를 심으면 의복은 해 입을 수 있습니다. 헌 가야금이 있으니 그것을 뜯고 선생님에게 배운 글로 책을 읽으며 살겠습니다. 저는 벼슬이 싫습니다.”하고 대답합니다. 공자는 평소 그런 안회를 “그대는 나보다 더 훌륭하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공자 나이 70세 되던 해 안회가 32세의 젊은 나이로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공자는 몹시 애통해 하면서 “하늘이 나를 망치는 구나, 하늘이 나를 망치는 구나!”하고 슬퍼했다고 합니다. 안회는 벼슬을 얻어 잘 살 수 있었음에도 그것을 마다하고 고고한 선비의 길을 택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장자(莊子․BC369~286)가 복수(濮水)강가에서 낚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초(楚)나라의 위왕(偉王)이 장자의 높은 인품을 소문으로 듣고 신하들을 그에게 보내 재상(宰相)으로 모셔 오라고 명을 내립니다. “선생이시여, 대왕의 분부를 받들고 이렇게 모시러 왔습니다.”
장자는 낚싯대를 쥔 채 돌아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내가 듣기에 초나라에는 신령한 거북이 있는데 죽은 지 3천년이나 되었다고 합디다. 왕께서는 그것을 비단에 싸서 묘당(廟堂)위에 고이 간직하고 있다지만 그 거북은 죽어서 뼈를 남긴 채 공경으로 받들어지기를 바랬을까요? 아니면 살아서 진흙 속에 꼬리를 끌며 다니기를 바랐을 까요?”
두 신하가 대답합니다. “그야, 당연히 살아서 진흙 속에 꼬리를 끌며 다니기를 바랐을 테지요.” 그러자 장자가 다시 말합니다. “어서, 돌아들 가시오. 나도 진흙 속에서 꼬리를 끌며 다닐 것이오.” 장자가 벼슬을 사양한 도가(道家)적인 일면을 보여 준 일화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번 총선에도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인물들이 출사표를 던지고 정치 입문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전국에서 1천수백명의 후보들이 달팽이 뿔위에서 싸우듯 와우각상지쟁(蝸牛角上之爭)을 벌일 모양이니우리 국민들의 특이한 정치 선호도를 보여 주는 현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민주주의가 좋은 것은 바로 그처럼 별다른 전과가 없는 이상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권리가 국민에게 주어진다는 점이고 당선이 되면 명예를 얻어 국민의 대표로 국가를 위해 일할 수 있다는 점일 것입니다.
선거에서 당선돼 ‘금배지’를 달면 그것은 대단한 출세입니다. 개인의 영예일 뿐 더러 가문의 영광이기도 합니다. 국회의원이라는 자리는 크나큰 권력이요, 대단한 ‘벼슬’이기에 그것을 얻으려고 너도 나도 선거에 뛰어 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국인이 유난히 권력을 탐하는 것은 조선조 500년을 지배한 뿌리 깊은 관존민비(官尊民卑)의 유교사상이 국민들 머릿속에 각인해 있는 것이 한 원인일 수 있습니다.
오늘 날 국회의원에 당선되는 것은 그 옛날 시골서생(書生)이 과거시험에 장원급제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일단 당선이 되면 그 보다 더 좋은 입신양명(立身揚名)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판사도, 검사도, 변호사도 말을 갈아타려고 달려들고 교수, 고위공직자, 돈 좀 번 기업인도 기를 쓰고 나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권력은 ‘마약’과 같다고 합니다. 마약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도 어려우려니와 한번 빠져들면 헤어나기가 더 어려운 게 마약의 속성입니다. 정치에 발을 들여 놓은 이들의 십중팔구 마지막이 불행한 것은 바로 그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한 여름밤의 부나방처럼 권력을 얻기 위해 앞 다퉈 정치판으로 몰려드는 것입니다. ‘욕망은 원죄(原罪)’라니까 그것을 나쁘다고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념도 철학도 없이 당선만 되면 그만이라고 이리 기웃, 저리 기웃하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정치판이 먹자판이 되어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욕을 먹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것을 모릅니다. 누군가 그랬습니다. “정치인은 다음세대를 생각하고 정상배(政商輩)는 선거를 생각한다”고.
1950년대 유행했던 노래 ‘불방아 도는 내력’의 한 구절을 소개합니다. -‘벼슬이 좋다지만~ 나는야 싫어~ 정든 땅 언덕위에 초가집짓고~ 낮에는 밭에 나가 길쌈을 매고~ 밤이면 사랑방에 새끼 꼬면서~ 새들이 우는 속을 알아보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