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을 생각하며>
짜고 치는 '고 스톱'
ㅡ백악관 출입만 50년,
케네디부터 오바마까지
10명의 대통령을 취재한
92세의 '할머니 기자'.
그녀는 '전설'이 되었다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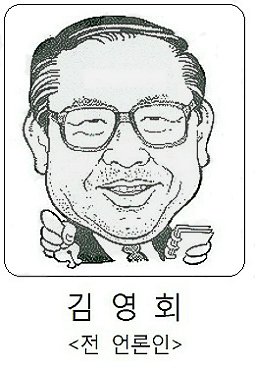
헬렌 토머스(Helen Thomas)라는 여기자가 있었습니다. 미국 UPI통신의 백악관 출입기자로 1961년 케네디대통령부터 현 오바마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무려 50여년동안 존슨, 닉슨, 포드, 카터, 레이건, 부시, 클린턴, W부시 등 10명의 대통령을 취재했던 전설적인 여기자입니다.
여기자라고는 해도 1920년생으로 2013년 92세 된 해까지 펜을 놓지 않고 일선기자로 활약을 하다가 세상을 떠났으니 ‘할머니기자’요, ‘종신기자’였던 셈입니다.
그녀가 언론에 발을 들여 놓은 것은 23세 때였습니다. 워싱턴데일리뉴스에서 복사와 커피심부름을 하는 사환으로 언론과 인연을 맺은 그녀는 UPI통신의 전신인 UP통신사에서 주급 24달러짜리 올챙이기자로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헬렌이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것은 1961년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백악관 출입기자가 되고 부터입니다.
그녀는 기자회견 때면 단도직입적이고 끈질긴 질문으로 대통령들의 애를 먹이면서 ‘대통령 전문기자’로 명성을 쌓습니다.
백악관 브리핑 룸에서 그녀의 자리는 언제나 맨 앞줄 가운데가 지정석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대통령과 얼굴을 마주 보는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첫 번째로 그녀가 질문을 시작하는 것이 하나의 관례였고 “Thank you. Mr. President”(대통령, 감사합니다)라는 인사로 회견을 마치는 것 또한 그랬습니다. 그녀는 백악관 기자단의 간사였던 것입니다.
헬렌은 답변이 시원찮으면 계속 추가 질문을 퍼부어 댔고 대통령과 말싸움을 벌이는 일도 비일비재했습니다. 대통령이 어물어물 적당히 넘어가는 것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대통령과 삿대질을 해 가면서 목소리를 높여 언쟁을 벌이는 일은 흔히 보는 장면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조지 W 부시대통령과의 이라크전쟁을 놓고 벌인 설전은 그녀의 ‘무용담’중 단연 백미(白眉)입니다.
헬렌은 부시 대통령에게 “미스터, 프레지던트. 당신의 이라크 침공으로 수많은 미국인과 이라크인들이 목숨을 잃었다. 당신은 왜 전쟁을 일으켰는가? 석유 때문이 아니라면 무엇 때문인가?”하고 돌직구를 날립니다. 대통령이 화를 낸 건 당연했고 그녀 역시 지지 않았습니다.
사실 미국의 이라크 침공은 석유 때문에 이런저런 트집을 잡아 전쟁을 일으켜 후세인을 축출하고 수많은 사람을 죽인 것은 잘 알려진 일입니다. 그녀는 그런 부시의 행동을 통렬히 비판하면서 ‘미국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이라고 공격하기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헬렌은 그런 기질 때문에 백악관의 ‘왕따’가 되기 일쑤였고 보복도 감수해야 했습니다. 부시대통령이 그에게만 질문기회를 주지 않고 골탕을 먹이는 일도 예사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대통령은 겁쟁이다. 그는 오사마 빈 라덴에게는 덤벼도 나에겐 못 덤빈다”며 웃어넘기는 호방함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헬렌은 “기자에게 무례한 질문이란 없다. 기자는 질문하는 것이 특권이고 대통령은 질문에 답할 의무가 있을 뿐”이라고 그때마다 후배기자들을 독려했습니다.
헬렌은 남성 중심의 치열한 기자사회에서 두각을 보이며 무려 50년을 백악관을 지킨 전무후무한 여장부였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언론의 퍼스트레이디’라는 애칭과 함께 ‘백악관 기자실의 전설’, ‘백악관의 고정자산’이라는 호칭을 준 것은 당연했습니다.
헬렌은 2013년 7월 20일 워싱턴 자택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레바논 이민 2세로 무려 10명의 대통령을 취재한 기자. 그가 세계 언론사에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족적을 남긴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투철한 기자정신과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는 불굴의 용기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생전 “기자가 질문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왕이 된다”는 뼈있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헬렌은 1993년 7월 클린턴 대통령을 수행해 한국에 온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이미 국내 기자들에게도 명성이 나 있던 터라 클린턴 대통령 못지않은 시선을 끌었습니다. 그날도 앞줄 한 가운데 앉아 김영삼 · 클린턴 두 정상의 기자회견을 지켜보았으나 특별한 현안이 없어서 였는지 질문은 하지 않았습니다.
민주주의국가에서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국정현안을 국민에게 직접 설명한다는데 의미가 큽니다. 미국이나 유럽선진국에서는 그때그때 사안이 있을 때 마다 대통령이나 수상이 수시로 기자실에 들러 회견을 갖고 국민들에게 현안을 보고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선거 때는 시장에 찾아가 상인들의 손을 잡는 등 온갖 저자세 쇼를 하다가도 일단 당선이 되고나면 달라지는 게 공식이 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오랜만에 열린 박근혜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보면서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아직도 독재정권의 구태를 벗어나지 못한 권위주의가 그랬고 과거를 그대로 답습한 ‘시나리오’가 그랬습니다. 담화내용도 그러려니와 미리 각본까지 짜놓고 진행된 연출 역시 어색하기가 짝이 없어 솔직히 낯이 간지러웠습니다.
사전에 ▲질문자를 정하고 ▲질문내용을 미리 제출받아 답변 자료를 만들고 ▲순번을 정해 손을 들면 “아무개기자, 질문 하십시오”하고 ▲대통령은 탁자위에 미리 놓아 둔 자료를 슬쩍슬쩍 보면서 즉석답변을 하는 것처럼 연출하는 어설픈 모습이라니, 정말 민망함을 금치 못하게 했습니다.
배석한 참모들의 조마조마해 하는 긴장된 표정들이 안쓰러워 보일 정도였습니다. 추가질문도 없이 단 한 번 질문하고 끝나는 진행방식으로 도대체 국민의 궁금증이 해소된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말 한마디 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엑스트라로 앉아있는 나머지 기자들은 또 무엇입니까.
21세기 이 나라 최고권부(權府)인 청와대의 수준이 이 정도인가를 실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외국 기자들도 상당수 참석해 ‘짜고 치는 고스톱’을 지켜보았습니다. 좀 창피했습니다. 이것이 청와대 기자회견의 ‘감추고 싶은 진실’입니다.
생각을 바꾸고 고칠 건 고쳐야 합니다. 언제까지 과거의 비뚤어진 관행으로 비웃음을 당하렵니까. 박대통령이 좋아하는 말 중에 ‘적폐(積弊)’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바로 적폐입니다.
박근혜대통령은 2013년 2월 25일 취임이후 3년 동안 기자들과의 회견은 이번까지 단 세 차례 뿐 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번 기자들과 얼굴을 맞댄 것입니다. 과거 김대중 대통령이 5년 임기 중 150번, 노무현대통령이 150번, 이명박대통령이 20번 기자회견을 한 것과는 크게 대조됩니다.
소위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라면 대통령이 기자를 꺼려해서도 안되고 기자회견을 기피해서도 안됩니다. 언론을 통해 현안을 국민에게 소상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밤잠도 설쳐가며 열심히 일하면서 ‘불통’ 소리를 듣는 건 기자들과 소통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청와대 참모들은 겁내지 말고 관행을 바꿔야 합니다. 연출하고도 연출하지 않은 것처럼, 연출하지 않고도 연출한 것 같은 자연스러운 기자회견으로 바꿔 보기 바랍니다. 정치권에 ‘개혁타령’이 유행인데 그런 것 하나 바꾸지 못 할 이유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