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니야, 언니야
―시대의 변화속에
호칭도 바뀌고 있습니다.
남존여비 유교문화의 잔재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는 망발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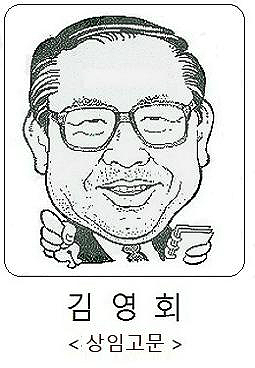
라임, 옵티머스 사건이 정치권을 뒤 흔들면서 그러잖아도 코로나19로 지쳐있는 국민들의 마음을 더욱 불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왜, 사건만 터지면 그것이 곧 여야당의 정쟁이 되고 사회 혼란의 중심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집안’인 법무부와 검찰이 맞장을 뜨는 이상한 형국에 검찰총장의 장모와 아내 이름이 뉴스를 타는 상황이 되었으니 세상이 어지럽지 않을수 없습니다. 딱한 노릇입니다.
오늘은 화제를 돌려 생활 속의 호칭(呼稱)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다 보면 여기저기서 종업원을 부르는 소리가 메아리처럼 들립니다. “언니야! 언니야!” 나이가 지긋한 중·노년의 손님들이 종업원을 자연스럽게 ‘언니’라고 부릅니다.
우리 주변의 주부들 가운데는 남편에게 “아빠! 아빠!”하고 애교 있게 응석을 부리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정한 연인들이 마주 앉아서 “자기야, 자기야!”하면서 깨알이 쏟아지듯 정다운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40~50대 중년이 20대 아들 같은 청년을 “아저씨!”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들입니다.
모두가 격에 맞는 호칭이 아니지만 어느 누구도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관습이 달라지면서 사람을 부르는 호칭도 예전과 다르게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언니’는 분명 나이 어린 여성이 손 위 여성을 부르는 호칭입니다. 그런데 부모 같은 사람이 자식 같은 젊은 사람에게 “언니, 언니”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아저씨’도 부모와 비슷한 나이의 타인에게 부르는 호칭이지 나이 든 사람이 젊은 사람에게 쓰는 용어는 아닙니다.
남편에게 ‘아빠’라고 하는 것이나 연인에게 ‘자기’라고 부르는 것이나 애교이든, 응석이든 옳은 표현일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는 이미 그것이 관습이 되어 자연스럽게 통용되고 있습니다.
국어사전에 보면 언니는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 난 사이이거나, 일가친척 가운데 항렬이 같은 동성의 손위 형제를 부르는 말로 주로 여성들 사이에 많이 쓰는 호칭입니다. 또한 남남끼리의 여성들 사이에서 자기보다 나이가 위인 상대를 높여 정답게 부르는 용어인 것입니다.
‘아저씨’는 부모와 같은 항렬에 있는, 아버지의 친 형제를 제외한 남자를 이르거나 남남끼리의 성인남자를 예사롭게 부를 때 씁니다.
우리나라는 과거 500여년을 유교를 국교로 해 왔기에 국민들의 의식 속에는 남존여비 사상과 체면을 중시하는 관념화된 의식이 몸에 배어있습니다. 그러기에 여성단체에서 제기하는 호칭 문제가 쉽게 고쳐지지 않고 그때마다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남녀가 결혼을 하면 여성은 남편의 본가를 시댁(媤宅)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남편의 동생에게는 나이가 어려도 “서방님,” “도련님”이라고 깍듯이 예를 갖춰야 하고 여동생에게는 “아가씨”라고 부르는 것이 관례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아내의 집을 처갓집이라고 부릅니다. 또 아내의 동생에게는 ‘처남,’ ‘처제’로 쉽고 편하게 하대(下待)해 부릅니다.

환경이 바뀐 입장에서 신혼 아내가 얽히고설킨 일가 친척 주변 인물에 대한 어색한 호칭을 쓰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버님, 어머님, 서방님, 큰형님, 작은 형님…등등 층층시하‘님’을 붙여 사사건건 존대를 하는 일은 새내기 주부로서는 고역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성단체에서 문제를 제기해 호칭의 평등화를 외치는 것은 충분히 이해되고도 남습니다.
하기야 호칭의 문제는 우리나라뿐이 아니고 서양에서도 얘기 거리가 되고 있긴 합니다. 일반적으로 미혼여성에게는 ‘미스(Miss)’라 하고 기혼 여성을 ‘미세스(Mrs)’라 부르는 게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일부 의식 있는 여성들이 들고 일어 나 “여자면 같은 여자이지, 미스는 뭐고, 미세스는 뭐냐”고 문제를 제기해 통칭 ‘미즈(Ms)’라는 호칭을 만들어 사전에도 올리고 새로운 언어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즈(Ms)는 결혼 여부에 상관없이 여성의 이름이나 성 앞에 붙여 부르는 경칭이 되었습니다. 짐작컨대 나이 든 기혼여성들이 앞장서서 주도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과거 우리나라에서 ‘각하’라는 존칭이 쓰인 때가 있었습니다. 각하(閣下)는 이승만 대통령에서 시작해 윤보선, 박정희, 최규하,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때까지 부르던 대통령에 대한 극존칭입니다. 그러나 문민정부에 들어 와 김영삼 대통령이 “각하라는 호칭을 쓰지 말라”고 지시해 비공식 석상에서만 썼고 그 뒤 김대중 대통령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각하가 뭐냐. ‘님’으로 불러라”라고 하면서 ‘대통령님’으로 호칭이 바뀌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당시인 2015년 초 국무총리 하마평에 오른 이완구씨가 용감하게도 남들 보라는 듯이 “각하!”라는 호칭을 써 시선을 끈 적이 있었습니다. 그 덕인지는 몰라도 이씨는 곧 바로 국무총리에 임명되었습니다.
유독 우리나라는 500년 뿌리 깊은 사농공상(士農工商)의 유교문화가 지배해 온 사회라서 호칭에 관해서는 매우 민감한 편입니다. 오늘 날 병원의 간호사는 원래 간호부이던 것이 간호원으로, 다시 간호사로 바뀌었고 자동차 운전기사도 운전수→운전사→기사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세칭 사윗감 0순위라는 사자돌림, 즉 의사(醫師), 변호사(辯護士), 판사(判事), 검사(檢事)는 전혀 변화가 없고 특이 한 것은 신문 방송의 ‘기자(記者)’는 뒤에 놈 자(者)자를 쓰지만 별다른 이론 없이 여전히 기자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꼴불견도 없지 않습니다. 장인, 장모를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 말입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나를 낳아 준 친부모입니다. 그런데 친밀하게 한다하여 장인 장모를 아버지, 어머니라 부르는 것은 그야말로 망발이요, 난센스입니다. 부끄러운 것을 모릅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11월 3일로 눈앞에 다가 왔습니다. 전 세계 제일의 초강대국인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는가는 모든 나라의 관심사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와는 6·25전쟁을 통해 맺어진 혈맹관계인데다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한·미관계, 남북관계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에 초미의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과연 누가 될까. 공화당 트럼프의 재선인가, 민주당 바이든의 당선인가. 정답은 며칠 뒤 밝혀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