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즈메이니아 데빌
―태어나면서부터 싸우는
태즈메이니아 데빌,
그 보다 싸움을 잘 하는
동물 1위는 단연 인간입니다.
인간은 왜, 그렇게 싸울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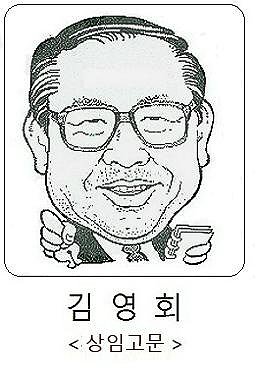
오스트레일리아 동남쪽 240㎞ 지점에 태즈메이니아란 섬이 있습니다. 면적은 62,409㎢로 제주도의 34배이고 인구는 51만 명으로 엇비슷합니다. 풍광이 매우 수려해 섬 대부분이 국립공원이며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도 지정된 오스트레일리아가 자랑하는 관광자원입니다.
이 섬이 유명한 것은 자연 경관이 아름답기도 하지만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태즈메이니아 데빌이란 희귀 동물이 이곳에서만 살고 있다는 점 때문이기도 합니다. 태즈메이니아 데빌은 수컷 몸길이 65㎝, 체중 8㎏로 작은 곰을 연상시키는 고양이만한 동물로 털색은 보통 검은 색 또는 암갈색이며 앞가슴에 흰색 달 모양 무늬가 있는 게 특징입니다.
태즈메이니아 데빌은 평소 관목, 숲, 바위 틈 등에서 살면서 개구리, 뱀, 가재, 게, 도마뱀, 쥐, 닭, 조류 등을 잡아먹고 살지만 사냥을 하기보다 동물의 사체를 먹기 좋아하고 자연에서 먹이를 구하지 못하면 마을로 내려와 쓰레기통을 뒤지는 습성이 있습니다.
또한 태즈메이니아 데빌은 동물의 사체를 파먹다가 그 속에서 잠을 자고 다시 파먹기를 반복하는데 털이 빠진 모습은 보기에 흉측한데다 냄새 또한 아주 고약하고 특히 소름끼칠 정도의 울음소리는 오싹하기 그지없어 세상에서 가장 추한 짐승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19세기 초 영국에서 처음 들어 온 이주자들은 이 동물을 악마 같다 하여 데빌(Devil)이란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붙여 오늘 날 태즈메이니아 데빌이 되었습니다.
태즈메이니아 데빌은 야행성 동물로 햇빛아래에서 쉬는 걸 좋아하는데 3, 4곳의 동굴을 규칙적으로 이용합니다. 그들은 얼굴에 비해 수줍은 동물이라서 서로 같이 다니지 않고 대신 혼자 자신의 시간을 보내기를 즐겨합니다.
그런데 태즈매니아 데빌은 마음에 드는 암컷을 발견하면 우선 다가가서 싸움을 걸고 암컷이 항복하거나 지쳐 쓰러질 때까지 공격을 가한 다음 자기 굴로 데려가서 가두어 놓고 즐거운 번식행위를 합니다. 태즈매이니아 데빌의 수명은 6~7년 살 수 있는데 보통 암컷이 수컷보다 오래 삽니다.
그런데 이 태즈메이니아 데빌은 원래 오스트레일리아 전역에 분포돼 있었으나 1990년대부터 안면 근육 암이 발생해 숫자가 줄어들기 시작, 14만 마리이던 것이 점점 줄어 2006년 8만 마리로, 2009년 2만 마리로 줄었고 현재 1만 마리밖에 살아남지 않아 멸종위기 동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동물의 세계 전문 채널인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의하면 지구상의 동물 가운데 싸우는 것을 좋아 하는 동물 2위가 바로 태즈메이니아 데빌이라고 합니다. 태즈메이니아 데빌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싸움을 시작합니다. 태즈메이니아 데빌 암컷은 임신한 뒤 21일 만에 새끼를 낳는데 보통 20~30마리를 출산합니다. 그런데 의아한 것은 어미의 젖꼭지가 4개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갓 태어난 새끼들은 당연히 젖을 먹기 위해 사생결단으로 싸웁니다. 힘이 센 놈은 젖을 먹으니 살아남고 약한 놈은 먹지를 못해 죽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 새끼들은 살아서 성장하는 놈 보다 굶어 죽는 놈이 더 많습니다.

그렇다고 싸움이 끝나는 건 아닙니다. 살아있는 놈은 옆에 있는 형제들과 계속 싸웁니다. 잠자는 시간을 빼 놓고는 싸우는 게 태즈메이니아 데빌의 삶입니다. 새끼들이 싸움을 그치지 않고 물고 뜯고 법석을 피우면 보다보다 지친 어미는 “옜다, 모르겠다”하고 새끼들을 버리고 그냥 가출을 해버립니다. 태즈메이니아 데빌의 일생은 싸움으로 시작해서 싸움으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이들의 몸속에는 애당초 싸움만을 위한 특별한 DNA가 들어있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싸움을 좋아하는 동물 1위는 무엇일까? 백수의 왕인 사자일까? 아니면 호랑이 일까? 그도 아니면 아프리카의 청소 동물 하이에나 일까? 아닙니다. 사자도 호랑이도, 하이에나도 아닙니다. 싸움 좋아하는 동물의 첫 번째는 바로 인간입니다.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이 지구상의 동물 중 가장 싸움을 좋아 하는 첫 번째 영예를 차지했습니다.
대개 동물의 싸움은 생존을 위한 싸움일 때가 많습니다. 상대방을 죽이지 않으면 자신이 죽는 절박한 세계에서 목숨을 건 싸움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중의 필수입니다. 동물은 영역을 빼앗으려고, 또 빼앗기지 않으려고, 먹이를 빼앗으려고, 암컷을 빼앗으려고, 무리의 우두머리자리를 빼앗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싸우는 것입니다.
인간의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념이 달라 싸우고, 종교가 달라 싸우고, 권력을 잡으려고, 땅을 빼앗으려고, 자원을 빼앗으려고 죽이고 죽고 싸웁니다. 한 학설에 의하면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합니다. 인류 역사 5000년에 전쟁이 없었던 해는 240년에 불과했다고 학자들은 주장합니다. 그런데 그 240년도 전쟁을 하지 않았을 뿐 전쟁을 준비하는 기간이었다고 하니 동물의 세계에서 싸움이란 필요 불가결의 수단이 아닌가 하는 생각조차 갖게 합니다. 현재에도 지구상에 일 년 중 전쟁이 없는 날은 단 3일밖에 안 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하루도 평안한 날이 없이 백년하청으로 헐뜯고 싸우는 것을 보면서 동물의 세계를 살펴봅니다. 사람들은 입을 모아 평화를 이야기하지만 돌아서면 싸울 궁리로 밤을 새웁니다. 몇 발짝만 뒤로 물러나서 현상을 보면 아름다운 숲이 보이지만 사람들은 그를 마다하고 숲속에서 나무줄기만을 보고 서로 “내가 옳다”고 옥신각신 싸움을 이어갑니다. 시절은 조락(凋落)이 시작되는 한 가을. -시몬, 너는 좋으냐? 낙엽 밟는 발자국 소리가- 레미 드 구르몽의 시를 생각하는 아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