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는 민주주의의 꽃
―투표를 잘 해야 나라가
발전합니다. 최선이 없으면
차선을, 차선이 없으면 차악을.
북미회담에, 지방선거에,
월드컵까지 바쁜 6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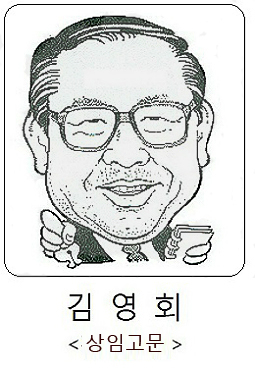
우리나라에서 지방선거가 처음 실시된 것은 1952년 4월 25일입니다.
1945년 일제로부터 해방이 되고 정부가 수립된 지 3년 6개월, 거기다 두 해전 일어난 6·25전쟁이 한창이던 혼란 속에 선거가 치러졌으니 처음 경험해 보는 지방자치의 출발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투표율 90.7%라는 국민의 높은 참여가 신생 독립국의 민주정치에 대한 기대를 부풀게 했습니다.
그 뒤 제2차 지방선거는 4년 뒤인 1956년 8월에, 3차 지방선거는 1960년 12월에 치러져 그런대로 연륜을 쌓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듬해인 1961년 박정희 소장이 주도한 5·16쿠데타로 헌정이 중단됨으로써 지방자치 ‘흑역사’의 암흑기는 시작됩니다. 민정이양이라는 허울 좋은 구실은 내세웠지만 군복만 바꿔 입은 군사정권은 이후 철권통치로 정치를 후퇴시키고 국민들을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지방자치가 명맥을 이은 것은 1991년 3월 26일 지방선거가 재개되고서입니다. 1987년 6월 항쟁으로 헌법이 개정돼 30년 만에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의원선거가 다시 실시된 것입니다. 그러나 시·도지사, 시장, 군수 등 자치단체장과 의원을 동시에 선출한 것은 1995년이었으니 이 해를 실제적인 지방자치 원년으로 삼아 이번 선거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국동시 지방선거는 전국에서 시·도지사(광역단체장) 17석, 시장·군수(기초단체장) 226석, 시·도의원(광역의원) 824석, 시·군의원(기초의원) 2927석, 시·도교육감 17석, 교육의원(제주특별자치도) 5석 등 총 4016명을 선출합니다. 이 가운데 충북은 도지사, 교육감, 시장·군수 11명, 도의원 32명(비례 3명), 시·군의원 132명(비례 16명) 등 177명입니다.
국민의 직접투표로 대표를 뽑는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입니다. 전국 각 지역에서 선출하는 국회의원은 지역을 대표해 국정에 참여하지만 지방선거는 내가 사는 도와 시·군의 살림을 챙기는 대표를 뽑는 일이니 지방선거야 말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본이요, ‘꽃 중의 꽃’입니다. 지방선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좋은 인물을 선출하면 지역사회가 발전하고 그렇지 못한 인물을 선출하면 지역사회가 정체되는 것은 필연의 결과입니다. 그동안 국민들은 의정활동을 통해 자신이 뽑은 인물들의 공과 과를 눈으로 보아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대대로 봉사자의 겸손한 자세로 지역사회와 주민을 위해 헌신한 이가 있는가하면 어떤 사람은 ‘염불보다 잿밥’에 눈이 어두워 실망을 준 이도 부지기수였습니다. 선거 때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옥석론(玉石論)’의 중요성은 그래서 변함없는 검증의 기본이 됩니다.

옛 말에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라고 했습니다. “천하를 얻고자 하거든, 먼저 나라를 평온하게 하고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거든, 먼저 가정을 잘 다스리고 가정을 잘 다스리고 싶거든, 먼저 내 자신의 몸과 마음을 바르게 닦아야 한다”는 이 유명한 글은 사서삼경(四書三經)의 하나인 ‘대학(大學)’에 나오는 명구입니다. 정사(政事)에 참여하고자 후보로 나선 이들 가운데 이 몇 자의 글을 모르는 이가 없으련마는 그동안 우리가 보아 온 인물들 가운데는 전혀 다른 행동으로 주민들을 실망 시킨 일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헌정 70년, 사회 변천에 따라 선거 분위기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1950년대 이승만 자유당 정권에서 시작해 박정희 정권을 거쳐 1980년대 전두환, 노태우 정권까지만 해도 관권선거, 금권선거, 부정 투·개표는 의당 자행됐던 관행이었습니다. 이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과거사가 되었지만 그것은 집권 여당의 프리미엄이었고 국민들조차 ‘용인’했던 추악한 선거문화였습니다.
비록 더디긴 했지만 오늘 선거분위기가 이정도로 맑아진 것은 역대 선거를 지켜 본 필자의 눈으로 볼 때 놀라운 변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아직 내가 펼칠 포부를 내놓기보다 상대의 약점을 물고 뜯어 득을 보려는 일부 후보의 더러운 작태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선거문화가 상전벽해(桑田碧海)로 달라진 것만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선거는 축제입니다. 거리에 나가 보면 형형색색으로 유니폼을 갖춰 입은 젊은 운동원들이 로고송을 합창하고 율동을 보이는 모습은 격세지감을 느끼게 해 줄뿐더러 유권자들을 즐겁게 합니다. 그것이 자유로운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참 모습입니다.
역대 선거 때 마다 각 정당이 내세운 선거구호는 바로 우리나라의 선거 변천사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1950년대 자유당 정권 때 민주당의 “못 살겠다 갈아보자!”는 구호는 국민들의 폐부를 찌를 만큼 크게 먹혀들었습니다. 워낙 살기 어려웠던 시절인데다 사회 지도층의 부정부패가 심했기에 유행어가 될 만큼 크게 어필됐었습니다. 다급해진 자유당이 머리를 짜내 내놓은 것이 “갈아봤자 소용없다. 구관이 명관이다”이었는데 이 구호들은 당시의 시대상을 함축적으로 잘 묘사해 우리 현대사를 극명하게 나타내는 풍속도가 되었습니다.
결국 이승만 대통령은 전국적인 시위로 권좌에서 물러났으며 100년을 갈 것 같던 자유당 정권은 종말을 맞아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선거 때만 되면 “누구를 찍을까”하는 것은 많은 유권자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고민입니다. 미리 정당이나 후보자를 정해놓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겪어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혈연, 지연, 학연으로 뒤엉켜 돌아가는 것이 우리사회의 전통인지라 한번 쯤 망 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인지상정인 것입니다.
연(緣)이 없다하더라도 좋은 인성에 좋은 인품, 거기다 능력마저 출중하다면 금상첨화이겠으나 세상에 모든 것을 두루 갖춘 진선진미한 인격자가 어디 그리 흔하겠는가. 그래도 최선(最善)이 없으면 차선(次善)을 선택하고, 차선이 없으면 차악(次惡)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선거의 법칙입니다.
근년에 와 국민의 투표 참여율이 점점 줄어드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은 아닙니다. 그동안 정치인에 대한 불신이 점점 커진데 대한 결과이겠으나 이런 현상은 개선돼야 합니다. 정치에 대한 불신이 크면 클수록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것이 민주시민의 자세입니다. 올 6월은 유난히 더 바쁩니다. 지방선거에, 싱가포르 북미회담에, 러시아 월드컵에 큰일들이 줄줄이 있습니다.
바야흐로 절기는 망종(芒種)이 엊그제니 농촌은 연중 가장 바쁜 철이고 이제 열흘 남짓이면 장마가 시작됩니다. 부디 세상만사가 뜻대로 잘 돌아가기를 바랄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