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을 생각하며>
국 치 일
-나라가 망한 대가로
어떤 사람들은 상을 받고,
어떤 사람들은 목숨을 끊고,
백척간두 민족의 모습은
그렇게 달랐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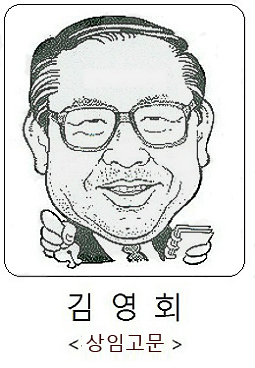
그날도 전 날과 다름없이 거리는 평온했습니다. 다른 것이 있었다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순사와 헌병들이 길목에 서서 경계를 펼치는 것 말고는 별 달리 다른 모습은 없었습니다. 1910년 8월 29일, 대한제국의 수도인 한성(漢城)의 풍경은 그랬습니다.
이튿날 조선 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는 “모든 소란이 한성에서부터 시작되는데 한성이 조용하니 다른 지방도 걱정할 것이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평온은 이미 1주일 전 창덕궁에서 열렸던 어전회의(御前會議)에서부터 예견되었습니다. 국가의 존망이 걸린 중차대한 회의였음에도 누구 한 사람 반대하는 사람도 없이 사전 각본에 따라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1905년 을사조약으로 이미 외교권을 빼앗기고 총리대신 이완용과 송병준 등 친일파들이 “빨리 합방해 달라”고 청원서를 만들어 바치는 등 일본에 충성경쟁을 벌이던 터였기에 실은 이상 할 것도 없었습니다. 1392년 개국해 519년 간 지속돼 온 조선왕조는 27대를 끝으로 그렇게 허망하게 막을 내렸습니다.
합방에 성공한 일본은 곧바로 공이 큰 한국인들에게 논공행상(論功行賞)을 실시합니다. 왕족과 고위관리 76명에게 작위(爵位)를 수여했고 관리 3559명, 양반과 유생(儒生) 9811명에게는 은사금을 주었습니다. 또 재소자 1700명을 석방하고 3200명의 효자 효부 열녀, 7만902명의 과부와 노인들에게는 위로금을 주었습니다. 일본은 그처럼 선심을 씀으로써 민심을 회유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망국의 분을 삭이지 못해 목숨을 끊어 항거한 이도 전국에서 45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선비 황현을 비롯해 금산군수 홍범식도 있었고 전라도 어느 마을의 머슴 돌쇠도 있었습니다.
나라가 망한 대가로 어떤 사람들은 원수로부터 돈과 명예를 얻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의분을 못 이겨 죽음의 길을 택했으니, 백척간두에 선 나라의 운명 앞에 같은 민족이 보인 모습은 그렇게 달랐습니다.
과거에 급제했으나 관직에 나가지 않고 고향인 전라도 구례에 묻혀 살던 매천(梅泉) 황현(黃玹)은 합방 소식을 듣고 참담한 심정으로 “나는 나라가 망했다하여 반드시 죽어야 할 의리는 없다. 그러나 나라에서 500년간 선비를 양성해 왔는데 선비로서 어찌 한 사람 죽는 이가 없어서야 되겠는가”라는 유서와 함께 “바람에 흔들리는 촛불 빛은 창천에 비치네. 가을 등잔에 읽던 책 덮어두고 천고의 옛일 생각하니 어찌하여 이 세상에 글 아는 사람이 되었던가”라는 절명시(絶命詩)를 남기고 분연히 자결했습니다.
충청도 괴산 사람인 금산군수 홍범식(洪範植)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명문가 출신이면서도 평소 나라에 대한 생각이 깊었던 홍범식은 전임 군수에 의해 국유로 몰수되어 빼앗긴 백성들의 땅을 찾아 주는 등 평소 선정(善政)을 베풀어 군민들의 칭송을 받았습니다.

홍범식은 일본이 한국을 집어삼키려는 음모를 일찍 알아채고 남몰래 괴로워하면서 “아, 내가 이미 사방 백 리의 땅을 지키는 몸이면서도 힘이 없어 나라가 망하는 것을 구하지 못하니 속히 죽는 것만 같지 못하다”며 비장한 각오로 미리 유서를 써놓고 급기야 합방이 발표되자 의분을 못 이기고 뒤뜰의 소나무에 목을 맵니다. 그가 죽은 뒤 안방에는 ‘國破君己 不死何爲’(국파군기 불사하위·나라가 망하고 임금이 없어지니 죽지 않고 어찌 하리)라는 여덟 자 유시(遺詩)가 붙여져 있었습니다. 이때 그의 나이 40세. 홍범식은 소설 ‘임꺽정’의 저자로 월북해 부수상을 지낸 홍명희의 아버지입니다. (송건호·한국현대사)
해마다 8월이면 우리는 ‘빛과 그림자’의 두 역사적 사실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는 ‘해방의 기쁨’이요, 또 하나는 ‘망국의 치욕’입니다. 36년의 사슬에서 해방된 그 기쁨이야 아무리 열광한다 해도 지나침이 없고 나라를 빼앗긴 그 비통함 역시 아무리 통탄한들 회한이 풀릴 리 없습니다.
병자호란 때 인조(仁祖)가 송파 삼전도(三田渡)에서 땅바닥에 엎드려 청나라 임금 숭덕제에게 무릎을 꿇고 세 번 절하는 삼배구고두례(三拜九叩頭禮)의 치욕은 있었지만 통째 나라를 내어주고도 저항 같은 저항 한번 해보지 못하고 식민지 노예로 전락해 버리고 만 것이 당시 우리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역사상 가장 뼈아픈 ‘국치일(國恥日)’은 국민의 뇌리에서 잊혀지고 흔적마저 찾아보기 어렵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난날 학교에서는 “일본에 나라를 빼앗긴 치욕의 날”이라고 가르치고 달력에는 8월 29일 글자 밑에 ‘국치일’이라고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있어 “아, 오늘이 그 날이구나”하고 마음을 가다듬곤 했었는데 언제부터인가 그 세 글자가 슬그머니 사라져 버려 없어진 지 오래입니다.
무엇 때문일까. 부끄러운 역사이기에, 뼈아픈 과거사이기에,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일이기 때문일까. 아니면 우리 국민의 ‘고질’인 망각증 때문일까. 나는 정녕 그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엊그제 8.15 광복절은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온통 성대한 기념식을 열고 박수치고, 만세 부르며 환호했지만 정작 나라가 망한 국치일은 입에 올리는 것조차 꺼려하고 있는 게 오늘 우리 사회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때는 “역사를 바로 세우겠다”는 대통령도 있었고 “올바른 교과서를 만들겠다”는 소리도 들렸지만 그것이 또 다른 ‘꼼수’로 밝혀지면서 국치일은 그냥 그렇게 잊혀지고 있습니다.
듣자 하니 역사기록은 민족의 자존감을 위해 “우람하게 기록해야 한다”는 기준이 있다고도 하고 자랑할 일도 아닌 것을 잊지 않고 대대손손 전할 필요가 있느냐는 나름의 충정 때문이 아니겠느냐는 의견도 들리긴 합니다.
역사란 있었던 일을 사실대로 기록하고 전하는 것이 정도입니다. 축하할 것은 축하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하는 것이 제대로 된 역사입니다. 일 년에 단 하루만이라도 온 국민이 진정 어린 마음으로 와신상담(臥薪嘗膽), 그 날의 쓰디쓴 기억을 반추(反芻)하고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가를 성찰하는 것이 옳은 태도입니다.
나라의 힘이 모자라서 그랬는지, 이 나라, 저 나라 대국의 앞잡이 노릇을 하느라 패를 갈라 싸우다 보니 그 지경이 되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말입니다. 1910년 1700만 민족이 식민지 치하의 노예로 전락해 36년 동안 어떤 수모를 겪었습니까.
역사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천추만대(千秋萬代) 전해지는 것이 역사입니다. 요순(堯舜)의 태평성대도, 진시황의 폭정도 그대로 전해지고 네로 황제의 악행도, 히틀러의 만행도 후세에 그대로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역사입니다. 좋은 것만 골라서 기억하고 나쁜 것은 기억에서 지우려 한다고 해서 지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죽으면 자식들이 모여 해마다 제사를 지냅니다. 하물며 나라가 망한 날에 국민들이 그것을 잊고 있다면 그건 또 하나의 수치요, 역사에 대한 배덕(背德)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노래하고 춤추고 배불리 먹고 술 취해 희희낙락하는 일이 아니요, 국론을 통합하고 좀 모자라도 같이 손잡고 함께 가는 공평한 사회를 만드는 일이 먼저입니다. 누군가 말했지요. “용서하라. 그러나 잊지는 말라”고. 또 있습니다.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는 민족은 또 다시 같은 비극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고. 경술국치 107년, 오늘 그것을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