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을 생각하며>
작은 나라, 큰 나라
-조선조 500년은
사대주로 얼룩진 역사,
21세기 오늘 대한민국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그것이 궁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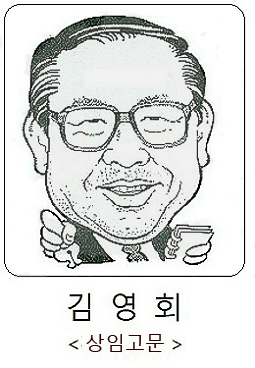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군사들을 되돌려 고려를 쓰러뜨리고 1392년 조선을 건국한 뒤 첫 번째로 한 일은 국호를 정해 명나라의 승인을 얻고 왕위 책봉(冊封)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이성계는 ‘화령(和寧)’과 ‘조선(朝鮮),’이라는 두 가지 이름을 지어 사신을 명나라로 보내 하나를 선택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화령은 오늘날 북한의 함경남도 영흥(永興)의 옛 지명으로 바로 이성계가 태어 난 고향이름이었고 조선은 고조선의 후예라는 뜻이었습니다.
명나라 황제 홍무제(洪武帝)는 국호로 조선을 승인하고 국왕책봉은 하지 않은 채 권지고려국사(權知高麗國事)라는 직책만을 내립니다. 이는 정식 국왕이 아니라 고려국왕을 대신하는 자리라는 뜻으로 왕은 왕이지만 무력으로 잡은 정통성이 없는 왕이니 더 두고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명 황제의 금인(金印)을 받아 정식으로 왕에 책봉된 것은 1401년 3대 태종에 이르러서였으니 조선이 개국된 지 9년 만의 일입니다.
그로부터 조선은 국왕의 즉위에는 책봉을, 죽었을 때에는 시호(諡號)를 받고 또 종속의 상징으로 명나라 연호(年號)를 사용하는 한편 성절사(聖節使), 천추사(千秋使), 정조사(正朝使), 동지사(冬至使) 등의 이름으로 일 년에 몇 차례 사신을 명나라에 보내 군신(君臣)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이때 조선의 사신들은 공물(貢物)로 금과 은, 말, 인삼, 모시, 호랑이 가죽, 나전 등을 말에 싣고 가 명나라 황제에게 바쳤습니다.
당시 조공 품 가운데 진상품으로는 처녀조공(處女朝貢)을 으뜸으로 꼽았습니다. ‘명사(明史)’에 보면 때가 되면 명나라 사신이 각 지방에서 뽑힌 처녀들을 심사해 그 중 미인들을 골라 데려갔는데 태종 때에만 40명을 보냈다는 기록이 있고 그 뒤에도 해마다 수십 명씩을 뽑아 갔다고 합니다.
흔히 조선조 500년을 말할 때 명나라에 대한 ‘사대주의(事大主義)’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오래전부터 동쪽 오랑캐(東夷)로 불려졌던 조선은 숙명처럼 명나라를 상국(上國)으로 섬길 수밖에 없었던 것이 당시의 시대 상황이었습니다. 조선의 역사는 곧 사대주의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작은 나라가 크고 힘센 나라를 섬기는 사대주의는 동서양을 불문하고 만고불변으로 통해오는 진리입니다. 자기 나라보다 강한 국가나 세력에 복종하면서 추종하고 찬양하는 것은 약한 나라의 지혜요, 생존전략이기도 했습니다.
동아시아에 있어 ‘사대’라는 개념은 일단 유교의 기본 관념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를 섬기고, 제자는 스승을 섬기고, 신하는 임금을 섬기고, 지어미는 지아비를 섬기고 나이 어린 사람은 나이 많은 사람을 섬기고 작은 나라는 큰 나라를 섬겨야 한다는 생각은 유교적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고려시대 어느 날 최영 장군이 문신인 정몽주에게 묻습니다. “대감, 고려 사람이 왜 남의 나라를 지성으로 섬겨야 하는 것이 오니까?” 정몽주는 대답합니다. “그것은 약육강식의 천하에서 소국(小國)이 살아남는 생존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2014년 방송된 KBS 드라마 정도전 24화에 나오는 최영과 정몽주의 이 짧은 대화는 사대주의에 대한 궁금증을 간단명료하게 보여줍니다.
우리나라는 지난날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는 중국을 맹주로 삼고 역사를 이어 왔으며 근대에는 일본의 식민지로 36년, 그리고 해방이 된 뒤에는 미국이라는 또 하나의 거대세력에 편입되어 국가를 지탱해 온 게 사실입니다. 미국이 있었기에 일제로부터 해방이 됐고 6·25라는 절체절명, 누란(累卵)의 위기를 이겨낼 수 있었으며 척박한 환경을 딛고 오늘날 세계 유수의 국가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미국에 대해서는 ‘평화의 사도’니 ‘혈맹’이니, 아무리 미사여구를 동원해 찬양을 한다 해도 지나침이 없고 그것은 망각해서는 안 되는 국민정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눈에 보이게, 보이지 않게 간섭과 압력을 받아 오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공짜가 없다고 하듯이 미국의 도움을 받으면 받을수록 ‘주문’ 또한 많아지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21세기의 대한민국은 600년 전의 조선이 명나라와 맺고 있던 수직적 종속관계와는 어떻게 다를까. 표면적으로야 국가대 국가로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듯 보이지만 그것은 과연 실제로도 그러할까? 한 국가가 사대주의를 통해 역사를 쌓아 왔다면 그 국민은 그것과 무관한 민족적 자존심을 갖고 있을까.
사대주의에 대한 국민의 의식을 보여주는 좋은 예가 있습니다. 1883년 고종은 한해 전 체결한 조미수호통상조약에 대한 답례로 민영익을 정사(正使)로 하는 보빙(報聘) 사절단을 미국에 파견합니다. 이들은 태평양을 배로 건너 샌프란시스코에 상륙해 다시 열차로 워싱턴을 거쳐 뉴욕에 도착합니다.
그곳 호텔에서 대기 중이던 민영익 일행은 체스터 아서 대통령이 로비로 들어서자 재빨리 호텔 바닥에 넙죽 엎드려 무릎을 꿇고 큰 절을 올립니다. 조선식 관복에 사모(紗帽)를 쓴 일행들의 별난 인사에 대통령도 놀랐고 주변 사람들도 모두 놀랐습니다.

그로부터 232년 뒤인 2015년 7월 워싱턴의 한 식당. 이번에는 새누리당의 김무성 당대표와 9명의 국회의원들이 또 한바탕 진풍경을 연출합니다. 집권당의 차기 대권주자로 유력했던 김 대표는 미 조야의 유력자들과 친분을 쌓기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이었습니다.
이날 김 대표는 백발이 된 6·25 참전용사들과 유가족 수십 명을 호텔로 초청해 만찬을 베풀면서 감사의 표시로 함께 간 의원들과 비좁은 식당 바닥에 줄지어 무릎을 꿇고 엎드려 큰 절을 올립니다.

뜻밖의 해프닝에 절을 받은 참석자들이 당황스러워했고 절을 한 의원들도 쑥스러움이 역력했습니다. 200년의 시공을 뛰어넘어 국가지도자라는 이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똑같은 해프닝을 벌인 것은 사대주의라는 오래된 고정관념이 머릿속에 박혀 있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현지의 신문방송은 물론 국내의 매스컴들이 이를 흥미롭게 보도해 국민들의 낯을 뜨겁게 했습니다. 네티즌들은 “사대주의의 완결판이다”라며 “왜, 부채춤도 추지 그랬느냐”라는 등 비아냥으로 인터넷을 달구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를 놓고 나라가 온통 조바심으로 전전긍긍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민망함을 금치 못했습니다. 도대체 우리나라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미국 대통령을 만나는데 그리도 쩔쩔매야 하는지, 비애감마저 든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물론 상대가 트럼프라는 예측 불허의 특이한 인물이라서 또 어떤 쇼를 벌일지 몰라 걱정을 하는 것이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대한민국은 그 옛날의 조선이 아닙니다. 국력도 국력이려니와 국민의 의식 수준이 그때와는 현저하게 다릅니다.
‘과공(過恭)은 비례(非禮)’라고 했습니다. 지나친 공대는 예의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한때 미국의 쉰 번째 주(州)라고 업신여김을 당하던 필리핀의 두테르테 대통령이 “미국하고 오래 놀았으니 갈 테면 가라”며 할 말을 하는 것을 보고 부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민의 자존심이 그래 중요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