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을 생각하며>
6월이 가고 있다
-해마다 6월이 오면
구천을 떠도는 원혼들의
애끓는 소리가 들립니다.
동족상잔의 비극적 전쟁,
다시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광주 산곡을 헤매이다 문득 혼자 죽어 넘어진 국군을 만났다.
산 옆 외따른 골짜기에
혼자 누워있는 국군을 본다.
아무 말, 아무 움직임 없이
하늘을 향해 눈을 감은 국군을 본다.
누런 유니폼 햇빛에 반짝이는 어깨의 표식
그대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소위였고나.
가슴에선 아직도 더운피가 뿜어 나온다.
장미 냄새보다 더 짙은 피의 향기여!
엎드려 그 젊은 주검을 통곡하며
나는 듣노라! 그대가 주고 간 마지막 말을….
나는 죽었노라 스물다섯 젊은 나이에
대한민국의 아들로 나는 숨을 마치었노라.
질식하는 구름과 바람이 미쳐 날뛰는 조국의 산맥을 지키다가
드디어 드디어 나는 숨지었노라. (중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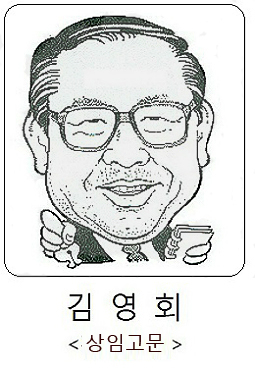
모윤숙(1910~1990)시인의 시 ‘국군은 죽어서 말한다’의 일부입니다. 포연 자욱한 산천에 피비린 내 가득하던 6·25전쟁. 그 전쟁이 3년 만에 휴전에 들어간 뒤에 쓴 모시인의 이 시는 절망에 빠져 황폐해진 국민들의 아픈 상처를 어루만져 줍니다.
올해는 6·25전쟁이 일어난 지 67주년 되는 해입니다. 그 전쟁은 우리 역사상 가장 큰 전쟁이었고 민족사를 붉게 물들인 비극 중의 비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직 끝나지 않은 진행형의 전쟁입니다. 지금은 휴전 중이기 때문입니다.
1950년 6월 25일, 그날은 마침 일요일이었습니다. 남과 북의 경계선인 38선 남쪽을 지키던 우리 국군장병들은 주말을 맞아 전날 거의 외박을 나가 있었고 부대는 별다른 경계태세도 없이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벽 4시, 철조망 북쪽에서 돌연 다급한 총소리와 함께 포성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북한 인민군이 선전포고도 없이 탱크를 앞세우고 기습남침을 감행한 것입니다. 서쪽으로 황해도 옹진에서부터 개성을 거쳐 동두천, 춘천을 지나 동해안 삼척에 이르는 38선 전역에서 일제히 공격을 가해 온 것입니다.
242대의 소련제 탱크를 앞세운 인민군은 단 한 대의 탱크도 없이 소총과 기관총, 박격포 등의 빈약하기 짝이 없는 무기로 무장하고 있던 국군을 큰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허를 찔린 국군은 제대로 대항해 보지도 못하고 적군의 위세에 쫓겨 뒤로 후퇴하기에 바빴습니다.
질풍처럼 거침없이 내려오던 인민군은 27일 저녁에 이미 서울 동북방 미아리고개를 넘어와 개전 사흘 만에 서울 시내로 진입하고 있었고 28일 수도인 서울이 적군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그 시각 KBS 라디오에서는 “우리 국군이 잘 싸워 적군을 격퇴하고 있으니 국민들은 안심하라”는 이승만 대통령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거리에는 인공기를 앞세운 인민군이 줄지어 들어오고 있는데 대통령은 “안심하라”고 방송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미 하루 전 참모들과 정부 고관들을 이끌고 경무대를 나와 재빨리 대전으로 피신해 있으면서 국민들에게는 생방송하듯 녹음방송을 했던 것입니다.
더욱 기막힌 것은 이날 새벽 3시 한강의 단 하나뿐인 인도교가 이미 국군에 의해 폭파돼 보따리를 이고 지고 다리를 건너던 800명의 시민들이 강물로 곤두박질 쳐져 목숨을 잃은 일입니다.
인민군은 거침없이 남진을 계속했고 전의를 잃은 국군은 소총을 거꾸로 멘 채 피난민 대열과 함께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긴급 소집된 유엔총회는 북한을 침략자로 규정하고 유엔군을 급파하기로 결정합니다. 미국을 비롯해 영국, 프랑스, 등 16개국이 유엔군의 일원으로 군대를 파견합니다.
7월 1일 일본에 있던 미 24사단이 가장 먼저 달려와 오산 근교에서 인민군과 맞섰지만 역부족이었고 대전으로 밀려 내려와서는 사단장 월리엄 딘 소장이 인민군에 생포당하는 어이없는 사건마저 일어납니다.
인민군은 대전에서 경부선과 호남선으로 진로를 나눠 한쪽으로는 낙동강을 향해, 한쪽으로는 호남평야를 거치며 순식간에 전라남북도를 장악하고 경상남도를 거쳐 부산으로 향합니다.
채 1개월도 안 돼 대구, 포항, 울산, 경주 그 이남을 뺀 모든 지역이 적의 치하로 들어갑니다. 대한민국의 국운이 풍전등화(風前燈火), 바람 앞의 촛불처럼 위기에 놓입니다.
그러나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터키, 필리핀 등의 유엔군이 속속 도착해 낙동강에 최후 방어선을 구축하고 공중전을 장악한 미 전투기의 파상적인 공세로 숨을 돌립니다.

9월 15일 유엔군 사령관 맥아더장군이 세계 전쟁사에 길이 남을 인천상륙작전을 감행함으로써 전세를 완전히 뒤바꿔 놓습니다. 인천에 상륙한 유엔군과 국군은 서울로 진격해 9월 28일 드디어 중앙청에 태극기를 게양합니다. 3개월 만의 수복이었습니다. 서울 이남의 인민군 주력부대들은 보급로가 차단된 데다 앞뒤에서 공격을 받는 매우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됩니다.
기세가 오른 유엔군과 국군은 38선을 넘고 북진을 계속 해 10월 10일 원산, 19일 평양에 입성합니다. 거침없이 북으로 향하던 국군과 유엔군은 10월 26일 압록강의 초산, 장진호, 혜산진에 다다랐고 통일은 목전에 다가온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11월 28일 28만 명의 중국 인민해방군이 인해전술(人海戰術)로 벌 떼처럼 강을 건너와 기세는 다시 중공군에게 넘어갑니다.
살을 에는 혹한 속에 중공군에 밀려 남으로, 남으로 후퇴를 거듭하던 국군과 유엔군은 결국 1월 4일 다시 서울을 내주고 맙니다. 하지만 일진일퇴의 공방 속에 곧 서울을 되찾았고 53년 여름까지 계속된 지루한 전쟁은 7월 27일 쌍방이 드디어 휴전에 합의함으로써 3년 1개월 2일 동안의 치열했던 전쟁은 막을 내립니다. 특기할 것은 전쟁 당사국인 한국은 이승만 대통령이 끝까지 휴전을 반대하고 북진통일을 주장해 휴전회담에서 배제됐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판문점 군사회담에 한국이 발언권도 없이 옵서버로만 참석하는 것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웃기는 일입니다.
6·25전쟁은 한반도 전체를 폐허화했고 남과 북을 가릴 것 없이 수많은 군인, 민간인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위키백과에 의하면 남한은 군인 민간인 합쳐 52만2600명이 사망했고 94만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43만5000명이 실종되는 등 총 189만8000명의 인명피해를 냈습니다. 20만 명의 전쟁미망인과 10만 명이 넘는 전쟁고아가 생겼으며 1000만 명이 넘는 이산가족을 만들어 냈습니다. 미군도 3만6600명이 전사했고 부상, 실종 등 13만 7000여명의 인명 피해를 냈습니다.
북한 역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군인 29만4000명이 전사했고 민간인 40만 600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부상, 실종을 합하면 70만 명 사망을 비롯해 총 332만 명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중공군은 18만3000명이 전사하는 등 59만2000명이 인명피해를 당했습니다. 북한인민군, 민간인, 그리고 중공군의 총 인명피해는 119만 명~157만7000명에 달합니다.
해마다 6월이 오면 한반도 산하에는 구천(九天)을 떠도는 원혼(冤魂)들의 애달픈 울음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도대체 누가 그런 참혹한 전쟁을 일으켰는가. 6·25전쟁은 미국과 소련, 두 강대국의 ‘이념놀이’에 꼭두각시가 된 극소수의 인물들이 민족을 둘로 갈라 ‘굿판’을 벌임으로써 금수강산이 불바다가 된 싸움입니다.
그 전쟁은 두 말할 것도 없이 북한 김일성이 조국해방전쟁이라는 미명하에 저지른 범죄이지만 분명한 것은 공산주의가 무엇인지, 자본주의가 무엇인지 알 턱이 없는 무고한 국민들이 전쟁의 희생물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남과 북 모든 국민의 한결같은 소망입니다. ‘나쁜 평화’는 있어도 ‘좋은 전쟁’은 없습니다.
가뭄이 극심합니다. 예년이면 장마가 시작될 때인데 때 이른 무더위가 서민의 삶을 더욱 힘들게 합니다. 제발 비라도 좍좍 시원하게 쏟아졌으면 좋겠습니다.

